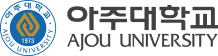아주인칼럼
![[칼럼] 이렇게 될줄 미리 알았다…정말일까 ?](/app/board/attach/image/thumb_55622_1372645474000.do)
NEW [칼럼] 이렇게 될줄 미리 알았다…정말일까 ?
- 이지윤
- 2013-07-01
- 28054
사후예측 혹은 사후확증 편향(hindsight bias)이라는 말이 심리학에 종종 등장한다. 이는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일이 결국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일컫는 현상이다. 사실 그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며칠 사이에 폭락하게 되면 많은 TV나 라디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로 폭락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곤 한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한번씩 가져본다. `저분들은 정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라고 말이다. 물론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예측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후예측 편향에 빠진 것이라고 한다.
이 편향이 일어나는 과정은 대략 이렇다. 먼저 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따라서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 반응은 `놀람`이다. 그런데 놀랐다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것이고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더더욱 싫다. 이 느낌을 감추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사람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할 수 없거나 사전에 예측되었던 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바로 사후예측 편향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편향으로 보기에는 더 큰 피해를 나 자신과 조직에 미친다. 기억의 왜곡과 재구성을 필요 이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요 며칠 사이에 폭락했다. 그리고 나는 사후예측 편향으로 인해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그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락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중에 폭락을 설명해 주는 일들만을 기억에 남긴다. 즉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나 징후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확증 편향은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편향된 기억을 이차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모든 것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운명론`이 조직 내에 만연하게 된다. 발전과 도약의 구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2000년대 초반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 미시건대학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이러한 사후예측 편향에 빠지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 편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 논문에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담겨 있다. 우리 문화가 상대적으로 `점잖음`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잖음은 상식적으로 놀람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보다 사후예측 편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다.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여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 하지만 `점잖음`을 강조하고 중요시한다면 놀라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더 자주 할 것이고 이는 다시금 사후예측 편향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만큼은 꽤 설득력이 있는 논리다. 점잖은 CEO,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지 않는 리더에게는 이렇게 어두운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6.28.]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