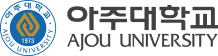아주인칼럼
![[칼럼] 방귀 뀌어도 모를 걸](/app/board/attach/image/thumb_55621_1372643843000.do)
NEW [칼럼] 방귀 뀌어도 모를 걸
- 이지윤
- 2013-07-01
- 27120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하면 술 냄새가 난다. 옆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미안하고 위축된다. 다행히 해부학 실습실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다. 술 냄새가 실습실 본래의 냄새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나는 실습하는 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는다. 술기운으로 힘차게 가르친다.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교육을 하는 셈이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학교에서 음주교육을 단속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갑자기 검문받아서 들키면 교육 정지 또는 교육 취소의 명령을 받을 텐데.’
이처럼 해부학 선생의 죄를 ‘사면’해 주는 실습실 냄새는 무엇일까? 시신 냄새 더하기 고정액(방부제) 냄새이다. 나의 글솜씨로는 도저히 이 냄새를 표현할 수가 없다. 딱히 어느 냄새와 비슷하지도 않다. 그저 실습실 냄새라고 일컫겠다. 환기 시설을 잘 갖추어도 실습실 안팎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의과대학의 남다른 공간이 해부학 실습실이듯, 의과대학의 남다른 냄새가 해부학 실습실 냄새다.
시신을 해부하는 선생과 학생은 이 냄새를 잘 견딘다. 처음에는 역겨워도 곧 익숙해진다. 문제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해부해 본 적이 없는 교직원이다. 실습실 앞을 지나다가 냄새를 맡으면 괴로워한다. 해부하는 사람보다 냄새를 덜 맡는데 왜 괴로워할까? 정보가 적기 때문이다. 밤에 낯선 길을 홀로 걸으면, 정보가 적은 탓에 귀신을 비롯한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따라서 무섭다. 마찬가지로 시신을 안 본 채 냄새를 맡으면, 정보가 적은 탓에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따라서 괴롭다.
나는 퇴직할 때까지 실습실 냄새를 피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좋은 것으로 여긴다. 밥 먹고 실습실에 들어갈 때에는 양치질하지 않아도 된다. 고맙게도 실습실 냄새에 가려져서 입 냄새가 나지 않는다. 실습실에서는 방귀를 뀌어도 아무도 모른다. 굳이 참을 필요가 없다. 눈치가 빠른 학생은 나처럼 실습실 냄새를 잘 써먹는다.
내가 조교일 때 해부학 실습실에서 학생들과 해부를 하고 있는데 한 잡상인이 들어왔다. 나와 학생들은 잡상인을 내보내지 않고 멀뚱히 쳐다봤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잡상인은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고, 실습실 안을 제대로 볼 만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더니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표정을 짓고 금방 나갔다. 잡상인, 빚쟁이, 좀도둑은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선생과 학생은 집중해서 실습하기가 좋다.
실습실에서 입는 흰 덧옷은 시신과 직접 닿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배며, 아무리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학생은 실습이 끝났을 때 흰 덧옷을 태워 버리거나, 대충 빨아서 후배한테 물려준다. 어떤 학생들은 어차피 다른 데서 쓸 수 없으니까 흰 덧옷에 각종 낙서를 한다. 해부학 용어를 적어서 외우는 학생도 있고, 인체 속 구조물을 그려서 표면해부학을 익히는 학생도 있다. 예를 들면 흰 덧옷의 소매에 팔 근육을 그리는 것이다. 물론 공부와 관계없이 가슴에 슈퍼맨 상징물을 그리는 학생도 있고, 등에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애인 구함’을 적는 학생도 있다.
실습을 마친 다음 손을 깨끗하게 씻고 겉옷을 갈아입어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 버스, 지하철을 타면 다른 손님들이 나를 피한다. ‘저 사람한테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일까? 처음 맡는 냄새인데,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다. 시궁창에서 일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굳이 가까이는 가지 말자.’ 덕분에 나는 대중교통을 호젓하게 이용한다.
집에 가서 목욕하고 속옷을 갈아입어도 냄새가 난다. 물론 가족은 어떤 냄새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나를 멀리하지는 않는다. 어려운 일을 마치고 갔는데, 가족이 팽개치면 불쌍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해부한 것을, 즉 돈 벌려고 해부한 것을 가족은 잘 알고 있다. 돈 앞에서는 냄새도 별 힘을 쓰지 못한다. 해부학 실습실의 냄새와 그에 따라 생기는 일들은 하나의 문화이다.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한겨레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