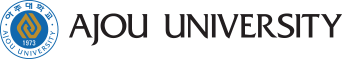Video
NEW 시인의 가슴을 지닌 과학자 최재천 교수 2004-2학기 4강 - 생명, 그 영원한 화두
- 2008-07-16
- 21550
최재천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한 후 미시건대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재직하며 인간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의 성과 사회성의 생태와 진화, 그리고 동물의 인지능력과 인간 두뇌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in Insects and Arachnids’(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Evolution of Mating Systems in Insects and Arachnids’(Cambridge University Press), ‘개미제국의 발견’(사이언스북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효형출판), ‘알이 닭을 낳는다’(도요새),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궁리), ‘열대예찬’(현대문학), ‘살인의 진화심리학’(서울대출판부),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궁리), ‘과학, 그 위대한 호기심’(궁리) 등이 있고, 역서로는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사이언스북스), ‘인간의 그늘에서’(사이언스북스),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궁리),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바다출판사)가 있다. 미국곤충학회 ‘젊은 과학자상’, 제1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제8회 국제환경상’, ‘2004년 올해의 여성운동상’ 등을 수상했다.
생명, 그 영원한 화두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가 생겼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이 생겼다고 한다. 생물학에서는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 죽음을 연구한다. 죽음이란 사실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도 신비롭지만 왜 일단 태어난 생명체가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는 더욱 불가사의하다. 요즘 세포생물학자들 중에는 특별히 세포의 죽음을 연구하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세포가 품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계획을 파악하면 노화는 물론 암과 같은 질병을 의외로 쉽게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들의 연구 한복판에는 도대체 왜 한번 만들어진 세포가 죽어야만 하느냐는 의문이 버티고 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그 많은 세포들이 모두 하나의 세포에서 갈려 나왔고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처럼 신비로운 게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 싶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면 곧바로 세포분열을 시작한다. 그 한 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수정란이 둘로 갈리고 또 넷이 되고 여덟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는 간세포가 되며 누구는 근육세포가 되고 또 누구는 장차 난자와 정자를 생성할 생식기관을 만든다. 누가 과연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
발생 초기의 세포들의 운명이 언제 결정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초기부터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으로부터 분열된 세포들의 수가 약 100개쯤 되었을 때 무슨 까닭인지 두 뭉치로 나뉘며 만들어진다. 이 때 세포들이 만일 이미 어느 기관의 세포들이 되라는 운명을 정해 받았다면 두 반쪽 인간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 때까지는 세포들이 어느 기관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완벽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세포로부터 갈려 나온 한 집안 식구들이라도 서로의 운명은 사뭇 다르다. 누구는 후세에 유전자를 남기는 생식세포가 되는가 하면 누구는 간이나 심장을 만드는 이른바 체세포가 되는 운명을 타고난다. 체세포들 속에 들어앉아 있는 유전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치받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생식세포 속에 들어 있는 동료 유전자들이 얼마나 잘 후세에 전달되는가가 결정된다. 어쩌다 보니 비록 다른 세포들 속에 흩어져 있게 되었지만 모두 협동해야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들의 공동 운명이다.
생명체는 누구나 한계성(ephemerality) 생명을 지닌다. 박테리아는 한 개체가 둘로 갈라지는 방법으로 번식한다. 그러나 어떤 박테리아들은 이른바 접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유전물질의 일부를 교환하여 회춘을 꾀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박테리아는 자기 고유의 개체적 특성과 성분을 잃지 않은 채 영원히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암수가 나뉘어 있고 짝짓기 과정을 거쳐야만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유성생물의 번식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섹스를 '죽음의 키스'라고도 부른다.
종교에서도 대체로 우리에게 일단 한계성 생명을 부여한 다음 믿음과 의식을 통해 영원불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불멸의 존재를 믿고 그를 거역하여 지은 원죄를 인정하면 내세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생명이 한계성을 지니되 그것을 담아줄 그릇, 즉 육체를 바꿔가며 윤회한다고 가르친다. 한계성을 전제로 한 생명의 개념이지만 영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명이 한계성을 지닌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얘기다. 생명체는 누구나 어김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의 형질들은 유전자를 통해 길이 자손 대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의 저자인 옥스퍼드 대학 진화생물학자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유전자 즉 DNA를 '불멸의 나선'이라 부르고 생명체는 그 불멸의 나선을 복제하기 위해 태어난 '생존기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버드 대학 생물학자 윌슨(Edward Wilson)도 이 관계를 "닭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 잠시 만들어낸 매체에 불과하다"라고 비유했다. 개체의 관점에서 본 생명은 한계성을 지니지만 유전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명은 영속성(perpetuity)을 지닌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긴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과체라는 뇌부위가 당시 인간의 뇌에서만 발견되었던 점을 바탕으로, 송과체가 바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혼(soul)이 담겨있는 곳이라는 사뭇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송과체는 다른 많은 척추동물들의 뇌에서 발견되었고 그 기능도 대부분 혼의 존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생명관은 기독교적 관념론과 더불어 지난 몇 천년간 서양의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지배해왔다. 창세기 제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 적혀 있다. 이 방대한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 어찌하여 이 넓은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그리 대수롭지도 않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 중 유독 우리만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것인가? 자연과학자인 나로서는 이는 철저하게 인간중심적인 오만 또는 신을 향한 우리의 짝사랑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구에 살아온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다 자연의 선택을 받는 동안 어떻게 우리 인간만 유독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인가? DNA의 기본구조는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하다. 다윈이 주장한대로 오늘날 이처럼 다양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모두 태초에 우연히 생성된 그 어느 성공적인 복제자 하나로부터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제가끔 보다 효율적인 복제를 위하여 다른 생존기계들 안에 들어앉아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하나의 조상을 모시는 한 집안 식구들이다. 이처럼 생명은 무수히 많은 가지를 뻗었으나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continuity)과 일원성(monism)을 지닌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명의 역사는 결국 DNA라는 한 독특한 화학물질의 일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화석 증거에 의하면 지구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거나 이미 사라져간 모든 생물들 중 인간은 거의 막둥이 격이다. 분자유전학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류와 침팬지가 하나의 공동조상으로부터 분화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500만년 전의 일이다. 500만년이란 시간은 진화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지구의 역사를 하루에 비유한다면 1분도 되지 않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현대 인류가 탄생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최근인 15만 내지 23만년 전의 일이고 보면 인간은 그야말로 순간에 '창조'된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셰익스피어도 "인간은 역사의 무대에 잠깐 등장하여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 종의 영장류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을 이 지구에 꽃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리 울었거나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생명은 이처럼 우연성(fortuity)을 지닌다.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자 굴드(Stephen Jay Gould)는 만일 우리가 지구 생태계의 역사를 담은 기록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 장면에 인간이 출현할 가능성은 거의 영에 가깝다고 단언한다. 자연선택은 어떤 목표를 향해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 미래지향적 과정도 아니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는 공학적인 과정도 아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난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완벽한 인간의 등장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생각은 지나친 인본주의 또는 인간중심주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은 이처럼 지극히 낭비적이고 기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하고 다분히 비인간적인 과정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지만 그처럼 부실해 보이는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단계들을 거듭하며 선택의 결과들을 누적시킨 끝에 오늘날 이처럼 정교하고 훌륭한 적응 현상들을 낳은 것이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명의 모습은 한없이 허무해 보인다. 그러나 그 허무와 염세의 뒤에는 뜻밖에도 평안한 겸허함이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을 ‘현명한 인간(Homo sapiens)’라고 부르는 오만함을 버리고 새롭게 ‘더불어 사는 인간(Homo symbious)’으로 거듭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