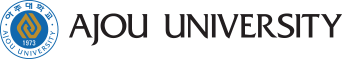Video
NEW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 진주검무보존회 2005학년도 1학기 제6강 진주검무
- 2008-07-16
- 19618
1.진주포구락무(경남무형문화재 제12호)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2호로 1991년 지정 된 포구락은 제기처럼 수술이 달린 채구(彩毬 : 색실로 장식한 야구공 크기의 공)를 포구문(抛毬門)의 풍류안(風流眼 : 포구문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에 던져 넣는 놀이를 악·가·무(樂·歌·舞)로 형상화한 궁중정재의 하나이다. 마치 농구가 공을 바스켓에 집어넣는 것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고 실제 포구락무에는 농구무라는 춤사위가 포함되어 있다.
풍류안에 공을 넣은 무희에게는 상으로 꽃을 주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눈주위에 먹으로 원을 그려 벌을 준다. 조선시대에는 공을 넣은 상으로 비단 등의 옷감을 주기도 하고, 아예 천민에서 해방시켜 주는 후한 상을 주기도 했다. 궁중정재에서 유래했을 진주포구락무는 궁중정재의 그것보다 몹시 축소⋅변화되면서 진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승되었다.
이 춤은 진주 감영의 연회는 물론 매년 춘추에 촉석루에서 개최되던 의암별제(義巖別祭)·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향사례(鄕射禮)·투호례(投壺禮)·향음주례(鄕飮酒禮) 등에 공연되었다고 한다.
2.의암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