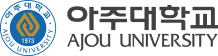아주인칼럼

우 리의 삶에 대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휘트먼(Walt Whitman)은 그의 유명한 「나의 노래」(Song of Myself)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만나는 이들, 내가 사는 읍, 도시, 국가의 영향들,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 나의 저녁식사, 외모, 사랑하는 그녀가 내게 보인 무관심(진짜이든 환상이든), 전쟁, 살인. 이들은 매일 밤 매일 낮 내게로 다가온다 그리곤 다시 떠나간다. 그러나 이들은 나 자신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매일 매일의 삶은 내가 사는 사회, 마주치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최근에 유행하는 것 등에 의하여 영향 받으며 형성되고 변형되고 지속되지만 휘트먼은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휘트먼은 또한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노래한다: “저기 가는 이 누구인가? 저 욕망하고, 야만스럽고, 신비롭고, 벌거벗은 이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욕망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삶은 직,간접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 사건들, 사회의 가치관들--이것을 정신분석철학자 쟈끄 라깡(Jacques Lacan)은 나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타자라는 의미에서 “대타자(Other)”라 부른다--로부터 심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갖는 욕망의 많은 부분은 나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런 점에서 라깡의 유명한 구절,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Men's desire is the Other's desire)"은 그 설득력을 더한다 하겠다. 이제 우리의 욕망이 진정한 우리의 욕망이 될 수 있을까?
이상적 아름다움에 도달하려는 욕망
이 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들의 욕망의 풍경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이가 공유하고 있는 욕망, 즉, “아름답게/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의 현주소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K대학 영문과 4학년 김수현, 판타시 소설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 매우 똑똑한 학생이다. 키 165cm, 긴 머리, 약간 통통한 얼굴의 그녀는 1년 전부터 약간의 현기증과 무기력함을 느낄 만큼 심하게 다이어트 중이다. 하루에 두 끼만을 먹고 식사 때는 반 공기 이상의 밥을 절대 금하며 간식 또한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어깨까지 드리운 긴 머리가 항상 양 볼을 조금씩 가리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수현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보름달처럼 동그스름하고 통통한 자신의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고 조금 통통한 몸매가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날씬한 몸매, 긴 생머리, 갸름하고 작은 얼굴을 가져야 데이트하고 싶은 남학생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취직면접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어쩌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 살이 1kg이라도 찌면 남이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날씬한 몸매, 갸름하고 작은 얼굴,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라는 “아름다운 여자”의 이미지가 매일 매일 수없이 반복해서 TV 드라마, 광고, 영화, 인터넷에 등장하여 대타자들(남자, 회사중역 등)의 눈과 감각을 깊이 물들이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이들로부터 “괜찮은”(desirable)"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수현에겐 이러한 강력한 이미지에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타자의 욕망에 자신의 욕망을 맡기는 사람이 어찌 수현 뿐이겠는가? 미모의 얼굴을 가졌지만 더 예뻐지고 싶어--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쁘게 보이기를 요구하는 대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대타자의 욕망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여 그 명령에 따라--수 십번 성형수술을 한 결과 얼굴이 기형처럼 변하게 된 ”선풍기 아줌마“를 우리 한국사회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비 단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적 아름다움”의 화신으로 그 찬란한 빛을 발하며 많은 이들의 눈과 귀와 심장을 녹이는 “아름다운 여자”의 이미지는 할리우드영화에 등장하는 여자주인공들이다. 지금 세계의 많은 영화관에서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는 할리우드영화 '킹콩(King Kong)'에 나오는 여주인공 앤(Ann, Naomi Watts분)은 많은 미국인들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이상적인 미인의 특성, 즉, 금발의 생머리, 푸른 눈, 날씬한 몸매를 가진 젊고 순수한 이미지의 백인 여자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지닌 주인공 앤은 자신이 동경하던 감수성 있는 시나리오 작가 잭(Jack, Adrien Brody분)으로부터 헌신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야수적 본능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야만적인 정글의 왕 “킹콩”도 사랑에 빠지게 하여 그녀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된다--“Beauty killed him"--는 이 영화의 러브 스토리가 웅장한 스펙터클과 때론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서스펜스와 더불어 관객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잡을수록 ”표준적 미인“의 이데올로기는 더욱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인 이미지는 영화 '아메리칸 뷰티(American Beauty)'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40대의 주인공 레스터(Lester, Kevin Spacy분)는 사회적 금기를 깨고 딸 제인 (Jane, Thora Birch분)의 친구 앤젤라(Angela, Mena Suvari분)에게 반하게 되는데 앤젤라 도 금발의 생머리와 푸른 눈 그리고 감각적 몸매를 가진 젊은 백인 여자라는 비슷한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다.
자신의 고유한 욕망에 귀 기울여야
젊 고, 날씬하고, 긴 생머리의 여자라는 이러한 미인의 이미지가 한국과 미국 모두의 대중매체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며 많은 이의 눈과 심장과 피를 물들이고 있다면 여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국경과 문화를 넘어 보편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뭔가 직접 어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에 대하여 '아메리칸 뷰티'의 한 주요 인물, 휘트먼, 라깡은 부정적으로 답한다. '아메리칸 뷰티' 에 항상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는 10대 소년 리키(Ricky, Wes Bentley)는 모든 남자가 자기에게 반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진 앤젤라에게 “넌 그저 평범할 뿐이야(You are just ordinary)"라고 선언하는 한편 많은 이들이 평범하게 보는 제인--자신의 가슴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방확대수술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을 정도로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과 바람에 흩날리는 비닐봉지의 움직임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에게 아름다움과 진정한 욕망은 사회의 대타자에 의해 반복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넘어선 고유한 무엇인 것이다. 휘트먼에게도 진정한 ”나 자신“은 밖에서 학습/주입되어 형성된 자아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거부하지는 않으나 그에 목메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자신이다. 라깡이 “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할 때 그가 강조하는 것은 대타자의 욕망에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의 욕망은 나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결여된 욕망이므로 이에 자신을 맡기기 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영화, 광고, 드라마 등 강력한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강박적으로 전면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대타자의 달콤한 명령에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욕망을 내맡기기 보다는, 이들을 아름다움의 한 형태로 보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고 이를 기뻐할 때 2006년이 멋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