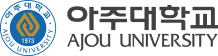아주인칼럼

UN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초과하면 '노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하며 14%를 넘어서면 '노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노령화(老齡化)사회'와 '노령사회'의 차이나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데 아마도 영어로 된 용어를 번역하여 쓰다보니 그렇게 굳어진 모양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마치 사회 전체가 늙어간다는 느낌, 노인이나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차라리 '장수사회(長壽社會)'나 '장수시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떻든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었고, 2005년에 8.7%, 2010년에는 10%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인 인구는 2000년에 18.2%를 기록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그리스, 스웨덴, 일본, 스페인에서 17%를 넘었고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15%가 넘었다.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총 인구의 4분의 1인 2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해왔다. 이제 인류는 의학 등 과학 문명의 발달로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소망을 곧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장수사회로 가기까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제들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사회와 개인에게 투자되어야할 비용의 급증인데 이 막대한 비용을 부양자와 당사자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15~65세 미만 인구 12.6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밖에도 노인들의 일자리와 취미, 건강, 가정생활 등 사회, 경제, 심리적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장수의 혜택을 누리게 될 개인의 의식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노인들은 단순한 고령자, 은퇴자가 아니다. 노인들은 수동적, 의존적 존재라는 관념으로부터 당당하고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조선시대에 앞선 아주 먼 고대사회부터 우리 민족은 특별히 노인을 공경하고 받드는 효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효의 특징은 대대적(對待的) 인지(認知)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른으로서 몸소 보이는 모범과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내리사랑,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바치는 존경과 효성. 말하자면 우리의 효는 쌍방향의 사랑이었다.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기에 나이에 대한 호칭도 다양했다. 공자의 표현을 빌려 30에 이립(而立)하여 40에 지천명(知天命)하고, 50에는 불혹(不惑)이라 했다. 만 60세가 되면 환갑(還甲) 회갑(回甲)이라 하여 축하 잔치를 벌였고, 70세는 종심(從心) 혹은 고희(古稀), 77세는 희수(喜壽), 88세는 미수(米壽)라 하였으며, 마침내 99세가 되면 백수(白壽)라고 하였다. 100세까지 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요즘도 뉴스가 되듯이 예전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더 없는 복으로 알았다. 반대로 부모는 물론 노인을 공경하지 않았다가는 패륜아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기도 하였다.
과거 우리의 전통사회는 철저한 유교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였다고는 하나, 똑같이 유교를 신봉하던 중국, 일본 등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효와 노인 공경이 잘 지켜지던 사회였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인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원만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래서 사회질서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더욱 크고 요란해보일 뿐이다. 적어도 노인문제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훌륭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 장수시대로 가는 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바로 우리 전통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인일보/04.05.28/세평)
어떻든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었고, 2005년에 8.7%, 2010년에는 10%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인 인구는 2000년에 18.2%를 기록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그리스, 스웨덴, 일본, 스페인에서 17%를 넘었고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15%가 넘었다.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총 인구의 4분의 1인 2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해왔다. 이제 인류는 의학 등 과학 문명의 발달로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소망을 곧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장수사회로 가기까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제들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사회와 개인에게 투자되어야할 비용의 급증인데 이 막대한 비용을 부양자와 당사자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15~65세 미만 인구 12.6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밖에도 노인들의 일자리와 취미, 건강, 가정생활 등 사회, 경제, 심리적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장수의 혜택을 누리게 될 개인의 의식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노인들은 단순한 고령자, 은퇴자가 아니다. 노인들은 수동적, 의존적 존재라는 관념으로부터 당당하고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조선시대에 앞선 아주 먼 고대사회부터 우리 민족은 특별히 노인을 공경하고 받드는 효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효의 특징은 대대적(對待的) 인지(認知)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른으로서 몸소 보이는 모범과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내리사랑,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바치는 존경과 효성. 말하자면 우리의 효는 쌍방향의 사랑이었다.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기에 나이에 대한 호칭도 다양했다. 공자의 표현을 빌려 30에 이립(而立)하여 40에 지천명(知天命)하고, 50에는 불혹(不惑)이라 했다. 만 60세가 되면 환갑(還甲) 회갑(回甲)이라 하여 축하 잔치를 벌였고, 70세는 종심(從心) 혹은 고희(古稀), 77세는 희수(喜壽), 88세는 미수(米壽)라 하였으며, 마침내 99세가 되면 백수(白壽)라고 하였다. 100세까지 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요즘도 뉴스가 되듯이 예전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더 없는 복으로 알았다. 반대로 부모는 물론 노인을 공경하지 않았다가는 패륜아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기도 하였다.
과거 우리의 전통사회는 철저한 유교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였다고는 하나, 똑같이 유교를 신봉하던 중국, 일본 등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효와 노인 공경이 잘 지켜지던 사회였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인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원만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래서 사회질서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더욱 크고 요란해보일 뿐이다. 적어도 노인문제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훌륭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 장수시대로 가는 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바로 우리 전통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인일보/04.05.28/세평)
이전글